 그래픽 : 박주현 부드러움이 가진 생명력은 때론 큰 벽의 틈사이에서도 그 꽃을 피운다.
그래픽 : 박주현 부드러움이 가진 생명력은 때론 큰 벽의 틈사이에서도 그 꽃을 피운다.
음악을 들으면 하나의 풍경이 떠오를 때가 있다. 1960년 발표된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Itsy Bitsy Teenie Weenie Yellow Polka Dot Bikini'는 그런 노래다. 십 대 소년의 앳된 목소리와 트위스트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눈부신 여름의 해변과 그곳에 서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아련하게 그려진다. 그 노란 물방울무늬 비키니가 부끄러워 물 밖에 나오지 못하던 그 소녀 말이다.
여름의 한가운데, 싸구려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상상한다. 눅눅한 바닷바람에 실려온 멜로디다. 모래알은 햇빛에 잘 데워져 기분 좋은 온기를 발끝으로 전하고, 멀리서 갯솜처럼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나른한 배경음악이 된다. 바로 그 순간, 치기 어린 목소리 하나가 귓가에 내려앉는다. 노란 물방울무늬 비키니가 너무 부끄러워 꼼짝도 못 하는 소녀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 노래가 흐르는 풍경 속에서, 세상은 잠시 모든 심각한 얼굴을 거두고 그저 풋풋한 여름의 일부가 된다.
그 노래 속 소녀는 아마 실존했을 것이다. 수많은 해변에, 수많은 마을에, 새로운 옷 앞에서 망설이던 수많은 마음속에. 비키니라는, 몸의 윤곽을 이토록 대담하게 드러내는 옷 앞에서 그녀가 느꼈을 것은 해방감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을 테다. 보이지 않는 규칙과 익숙한 시선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이다. 노래는 바로 그 소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는 나지막한 응원이었다.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부끄러움마저도 사랑스러워. 노래는 단단했던 금기의 벽에 '이쪽으로 와도 괜찮아'라고 속삭이는, 나만 아는 작은 쪽문을 내준 셈이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해변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비키니는 그렇게 대중화에 성공했다.
물론, 역사의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 다른 노래들이 먼저 무대를 점령한다. 베트남의 포화 속에서 밥 딜런은 마른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저항을 노래했고, 섹스 피스톨즈는 런던의 심장을 향해 전기톱 같은 기타 리프를 후려쳤다. 그 노래들은 분명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혁명의 목록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종차별의 폭력이 극에 달했던 1964년, 샘 쿡은 'A Change Is Gonna Come'을 불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를 외치는 대신, 강물처럼 유려한 목소리로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믿음을 노래했다. 그것은 투쟁의 선동이 아니라 상처의 고백이었고,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간절한 희망의 언어였다. 그 부드러운 가창은 총칼보다 더 깊숙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흑인 민권 운동의 비공식적인 성가(聖歌)가 되었다.
존 레논은 어떤가. 그는 'Imagine'에서 국가도, 종교도, 소유도 없는 세상을 노래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이념 중 하나를, 그는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실어 보냈다. 만약 그가 연설문으로 이 주장을 펼쳤다면 공허한 공상가의 외침으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장 위험한 사상을 가장 무해한 자장가에 실어 전 세계인의 침실로 배달했다. 그 결과, 이 노래는 이념의 벽을 넘어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여성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컨트리 가수 로레타 린의 'The Pill'은 페미니즘 학자의 두꺼운 책보다 더 많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었다. 피임약을 통해 비로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쥔 여성의 안도감을 노래했을 때, 그것은 광장의 구호가 아니라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은밀한 대화와 같았다. 수많은 방송국에서 금지곡이 되었지만,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수많은 보통 여성들의 삶 속으로 가져왔다.
오늘날 서울의 밤을 밝히는 K팝의 현란한 뮤직비디오는 이 '부드러운 힘'의 최신 버전이다. 그들은 이념을 설파하는 대신, 인간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아름다운과 매혹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행성의 문화 지형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이들로 인해 한국 혈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교포들과 스킨케어와 음식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심지어 영화, 드라마도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묻어야(?) 잘된다는 평가를 보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 아닌가? 세계 젊은이의 워너비로 부상한 한국, 그 자체의 위상을 되돌아보면 제 아무리 대규모로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한다 해도 이보다 효과가 컸을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 거대한 이념의 망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가닿는 작은 조약돌 하나가 아닐까. 조약돌이 던져진 수면 위로 동심원은 느리고 고요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번져나간다.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노래도, 샘 쿡의 기도도, 존 레논의 상상도 모두 세상을 향해 던져진 작고 예쁜 조약돌이었다. 세상은 어쩌면 광장의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어 깨우는 나직한 콧노래의 총합으로 서서히 물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근래 참 많은 정치적 대립이 빚어내는 소란스러운 풍경을 마주할 때면 숨 막히는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시절일수록 우리는 더 크고 단호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함성의 논리에 더 쉽게 익숙해진다. 나 자신조차 이 글에서 예찬한 그 부드러움이 가진 강함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 문득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하고 오만한 목표를 품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나의 노래가, 나의 멜로디가, 누군가의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에 닿아 이 메마른 세상의 풍경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꾸는 작은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나는 조용히 그것을 기도해본다.
 그래픽 : 박주현 지치지말고,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게 진정한 승리의 길일지도.
그래픽 : 박주현 지치지말고,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게 진정한 승리의 길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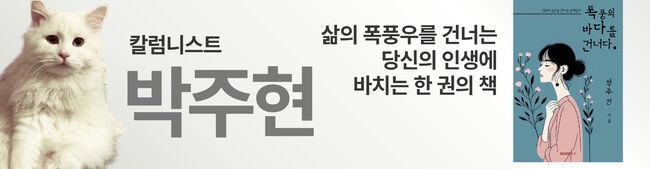

박주현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잔뜩 불안해 경직되었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기분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가진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고 누리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원 함미데이~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