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김민석 엄호’는 저널리즘이 아닌 궤변이다
2025년 6월 4일,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한민국 언론의 공직자 검증 시스템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스스로를 ‘비판과 감시’의 정론지로 자부해 온 한겨레의 보도 행태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안겨준다. 불과 3년 전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향해 제기했던 집요하고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은 김민석 후보자 앞에서 놀라울 정도로 무뎌졌다.
이는 단순한 보도량의 차이를 넘어, 특정 인물을 향한 ‘선택적 분노’와 ‘전략적 침묵’이라는 이중잣대의 전형을 보여준다. 더욱이 성한용 선임기자는 노골적인 ‘김민석 비호’ 칼럼을 통해 저널리스트의 본분을 망각하고,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며 한겨레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정권의 나팔수가 된 한겨레 신문 (그래팩=팩트파인더)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정권의 나팔수가 된 한겨레 신문 (그래팩=팩트파인더)
언론의 관심은 보도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측정된다. 한덕수 후보자 지명 직후 한 달간(2022년 4월 3일~5월 3일) 한겨레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된 ‘한덕수’ 관련 기사는 총 15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의혹 제기’ 및 ‘비판’ 기사는 60%를 상회했다.
당시 한겨레는 ‘이해충돌의 교과서’, ‘전관예우의 끝판왕’ 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김앤장 고문 활동과 고액 보수 ▲배우자 미술품 거래 의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및 국적 문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파고들었다. 사설과 칼럼은 연일 한덕수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했고,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들의 논조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해명하라’가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니 사퇴하라’에 가까웠다.
반면, 김민석 후보자 지명 이후 현재까지(2025년 6월 4일~) 한겨레의 관련 보도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참담한 수준이다. 이미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과거 ‘철새’ 논란과 정치적 신념 문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 ▲수차례에 걸친 당적 변경과 복당 과정의 불투명성 ▲2002년 대선자금 관련 의혹 등 굵직한 검증 대상들은 단신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외면당했다.
한덕수에게 들이댔던 집요함은 온데간데없다. 심층 분석 기사 대신 ‘여야 공방’이라는 기계적 중계 보도가 주를 이룬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한겨レ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러한 한겨레의 ‘선택적 검증’ 기조의 정점에는 성한용 선임기자의 칼럼이 있다. 그는 최근 칼럼을 통해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정치 공세’로 폄훼하고, 그의 기용을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전형적인 궤변(Sophistry)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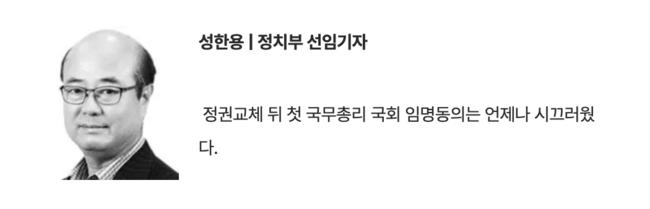 '김민석 후보자의 비리 의혹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해도 별로 무겁지 않다'고 두둔한 성한용 (한겨레 갈무리)
'김민석 후보자의 비리 의혹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해도 별로 무겁지 않다'고 두둔한 성한용 (한겨레 갈무리)
첫째, ‘피장파장의 오류’다. 성 기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과거 보수 정권 인사들은 더 심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논리를 편다. 이는 김민석 개인의 도덕성·자질 문제라는 본질을 상대 진영의 과오와 비교하며 희석하려는 물타기 수법이다. 공직자 검증은 절대적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지, 상대 평가가 될 수 없다.
둘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그는 비판자들이 ‘김민석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식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공격한다. 아무도 그의 정치 역정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그의 과거 흠결이 치명적이지 않은지를 묻고 있을 뿐이다. 성 기자는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 비판의 본질을 왜곡해 손쉬운 반박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결과론적 오류’다. 성 기자는 대의를 위해 김민석 카드는 불가피하며, 그의 작은 흠결은 눈감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저널리즘이 아닌 정치 공학의 언어다. 언론은 ‘전략적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고 정당화하는 곳이 아니라, 그 선택의 과정과 대상이 올바른지를 감시하는 곳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진실을 감추는 가장 교묘한 장막일 뿐이다.
한덕수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내려 했던 그 펜이, 왜 김민석 앞에서는 녹슨 몽둥이처럼 무뎌졌는가. 한겨레와 성한용 기자는 답해야 한다. 그들이 휘두르는 펜이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한 ‘창과 방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감시의 눈’인지 말이다. 지금과 같은 이중잣대와 궤변이 계속된다면, 독자들은 더 이상 한겨레를 ‘진보 언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특정 세력의 ‘나팔수’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