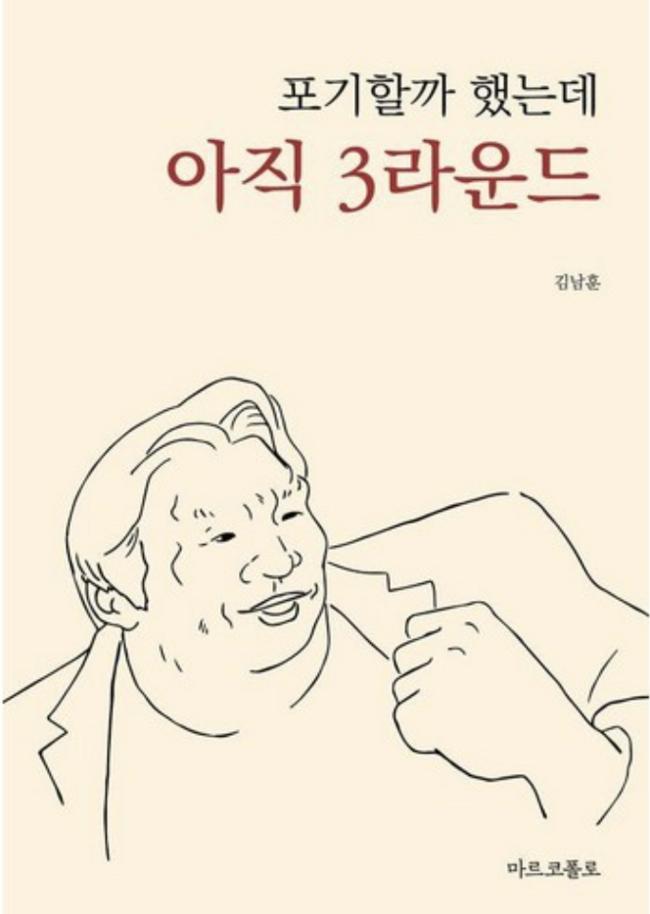영웅이 되고 싶은 자가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 차 밑에 사람이 깔렸다
2013년이었을까, 아니면 14년의 어느 날이었을까. 기억의 초점은 다소 흐릿하다. 당시 나는 EBS 라디오 <잉글리쉬 고 고>에 고정 출연하며 우면산 자락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곳은 행정상으로는 서울 서초구에 속했으나, 정서적으로는 위리안치에 가까웠다. 고속도로와 거대한 우면산이 도시의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고, 방송국 건물은 과거 안기부가 사용하던 곳이었다. 남산의 옛 교통방송 건물도 이러했었다. ‘산’은 자연스럽고 단단한 엄폐물이 되고 적대세력이 근접하기 위해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오르막을 오르는 수밖에 없다.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는 걷혔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황량함뿐이었다. 그 흔한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없이, 완만하게 굽어지는 길가엔 고급 주택과 낡은 상점, 그리고 편의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그날도 혼다 NC750의 시동을 끄고 그 편의점 앞에 닻을 내렸다. 안기부 시절의 유산인 방송국 로비는 자동차 두 대가 겨우 들어갈 만큼 협소했고, 자판기 하나만이 외롭게 윙윙거리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시절 내가 이곳에 왔다면 고문을 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으리라. 따라서 일찍 도착한 출연자가 시간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편의점뿐이었다.
그날 메뉴는 해물짬뽕면이었다. 비닐을 뜯고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 그리고 뚜껑의 끄트머리를 접어 열기 나가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그 일련의 과정은, 고독 속에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조하고도 신성한 순간이었다. 이제 3분을 기다리면 된다.
그때였다. 굉음이 고막을 찢었다.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주황색 쇳덩어리 하나가 인도를 덮치고 있었다. 택시였다. 차는 얇은 편의점 유리창을 경계로, 내 코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다. 젓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흩어진 정보들이 시각을 통해 빠르게 입력되었다. 주황색 차체, 깨진 보도블록, 그리고... 차 밑에 깔린 사람의 형상.
내 머릿속의 블랙박스가 본능적으로 되감기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창가로 돌아오던 찰나, 유리 너머로 스쳐 지나갔던 누군가의 잔상이 뇌리에 선명하게 현상되었다.
“택시를 들어 올려야 해!”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편의점의 정적을 갈랐다. 예닐곱 명의 사람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차량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간을 지배하던 공포와 당혹감의 시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편의점 사장님도, 컵라면을 먹던 여고생들도,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때 나는 4XL 사이즈의 옅은 핑크색 라이딩 재킷을 입고, 머리는 샛노란 금발로 탈색한 상태였다. 재킷 안에 내장된 어깨 보호대 덕분에 내 실루엣은 마치 미식축구 선수, 혹은 헐크 호건처럼 거대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명확했다. 이 재난 상황을 해결할 ‘물리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구원자, 그것이 바로 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아마 저들의 귓가엔 Led Zeppelin의 'Immigrant Song'이 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 시선들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무거운 추와도 같았다. 뜨거운 물을 머금은 면이 부풀기도 전에 에, 나는 갑자기 메인 이벤트에 출장하게된 프로레슬러처럼 편의점 문을 밀고 나갔다.
“자! 일단 거기 있는 아저씨 먼저 119로 전화하세요”
“다른 분들은 모두 제 옆으로 오세요”
“한번에 들어올려야 합니다”
“하나, 둘, 셋!”
구령은 절박했고, 타이어 타는 냄새는 비릿했다. 쇳덩어리는 무거웠다. 그것은 관념이 아닌 팩트였다. 나와 예닐곱 명의 사내들이 달라붙어 택시의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내 금발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근육의 섬유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 틈으로 누군가 차 밑에 깔린 사람을 끄집어냈다. 다행히 살아 있었다.
방송은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마이크 앞에서 나는 태연한 척 멘트를 뱉었지만, 내 자아는 여전히 우면산 자락의 찌그러진 택시 곁을 서성이고 있었다. 혼다 NC750의 배기음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헬멧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풍선 같은 허영심을 느꼈다.
2주 뒤 다시 프로그램 녹음을 위해 EBS에 갔다가 편의점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야기의 진짜 플롯은 그때부터 내 머릿속 편집실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내 기억을 다시 되감았다. 컷 단위로 재생을 하면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래, 거기 CCTV가 있었다. 렌즈는 그날의 영웅적 서사를 기록했을 것이다.
나는 익명의 제보자가 되기로 했다. YTN과 연합뉴스. 새로 만든 이메일 계정의 커서는 깜빡이며 나를 재촉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문장들은 제법 그럴싸했다.
 가상의 현장 인터뷰 (AI 합성 이미지)
가상의 현장 인터뷰 (AI 합성 이미지)
‘우면산 인근 편의점 사고, 금발의 덩치 큰 남성이 시민들과 함께 차를 들어 올려 사람을 구하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이미 영웅이었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 상상력은 헬륨 풍선처럼 대기권을 향해 상승했다.방송국 인터뷰 요청이 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겸손하게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때의 조명 각도는 어느 쪽이 좋을까. LG나 삼성에서 ‘의로운 시민상’이라도 주면 최신형 OLED TV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이 더 실용적일까. 트위터 팔로워도 늘겠지. 혹여나 정치권에서 연락이 오면 뭐라고 해야하나.
하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내 소박한 영웅담에 관심이 없었다. 며칠 뒤 도착한 답장은 건조하고 비정했다.
‘제보 감사합니다만, 해당 CCTV 자료는 보존 기한이 지나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비록 최신형 세탁기나 에버랜드 이용권은 얻지 못했으만 이또한 어떠랴. 잠깐 동안 내 삶에 활기가 돌았으니. 어쨌든 두 가지 교훈은 얻었다.
"데드리프트를 절대 게을리 하지마라. 언젠가 차를 들어올릴 때가 인생에 한 번은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주변의 CCTV는 꼭 미리 확보하자."
김남훈
포기할까했는데 아직3라운드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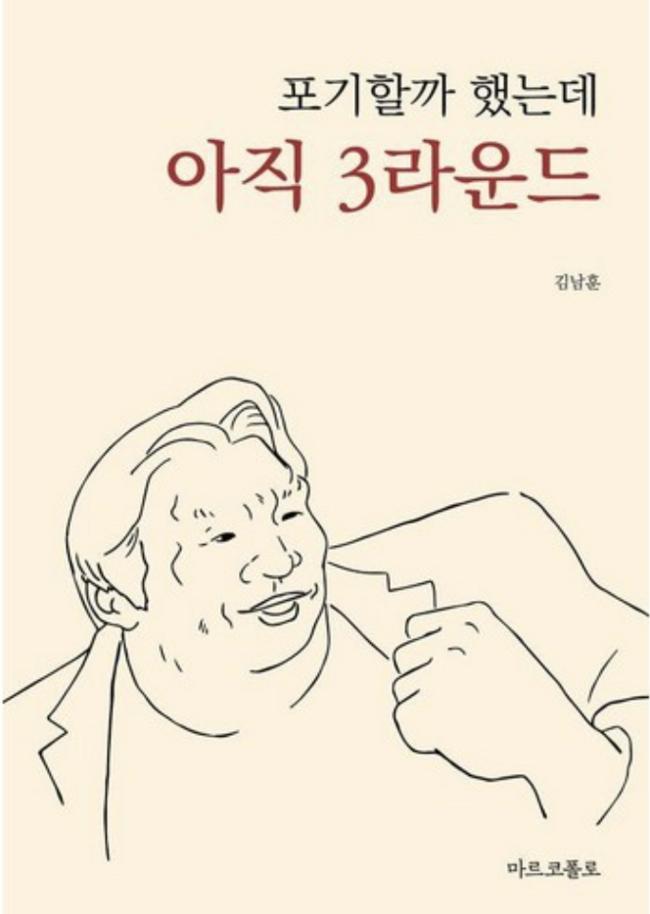
 가상의 현장 인터뷰 (AI 합성 이미지)
가상의 현장 인터뷰 (AI 합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