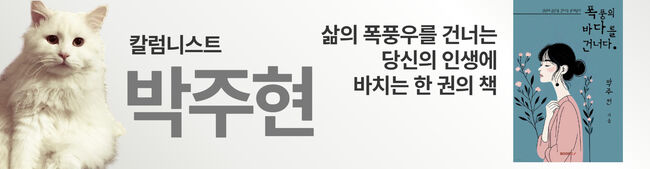<그래픽 : 박주현>
6억 원 대출 한도와 서민의 딜레마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며칠이 흘렀다. 이 규제의 목적은 명확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강남의 재건축 현장은 멈췄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6억 원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조합원 중 한 명이 쓴웃음을 지었다. "전세금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그의 말이 맞다. 규제는 공급을 막아 미래의 집값 하락 압력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 착공 건수는 2021년의 절반도 안 된다. 작년 동기 대비 41.3% 급감했다. 공급이 막히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정부가 모를 리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규제의 사각지대는 생각보다 넓다.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6개월 실거주 의무도, 6억 원 한도도 모두 우회한다. 올해 1~4월 외국인 매매 중 중국인이 66.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국내 규제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현금부자들은 더 여유롭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3억5천만 원인데, 대출이 줄어든 만큼 현금이 더 필요해졌다. 강남·서초 지역은 현금 25억 원은 있어야 입성할 수 있다. 그들에게 6억 원 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진성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매달 300만 원을 집값으로 내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는데, 그럼 진 실장은 서울 부동산이 매달 300만원 이상 안 오른다고 장담 할 수 있는가? 그럼 젊은이들은 대체 무슨 수로 집을 사라는 건가. 배경훈 과기부 장관 예정자는 정권 출범 직전 41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5천을 대출로 샀다. 규제 직전법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정말 단순한 우연인건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 "강남은 곧 무너진다."는 경고를 연일 쏟아 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영끌 매수에 나선 이들만 부자가 됐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당시 정권 내부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된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호재 지역의 상가를 약 25억원에 ‘영끌’ 대출로 매입했다. 당시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갭투자·영끌 매수를 강력히 경고했지만, 김 전 대변인은 정작 청와대 한복판에서 대출 규제를 비껴간 ‘갭투자’를 실행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으나, 자신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유지한 채 충북 청주 아파트만 매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방식으로 실거주 요건 및 보유 제한 취지를 회피했다. 이 때 국민들이 배운 학습효과는 명확하다. 정부 말을 믿으면 바보가 된다.
내 집마련을 꿈꾸던 젊은 부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포기할 것이다. 아니면 6억 원 한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반면 중국인들과 현금부자들은 여전히 강남에서 거래를 이어가겠지.
정부는 대출을 틀어막기 전에 재건축과 신규 공급을 늘려 집값 폭등 기대를 사전에 억제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재건축 사업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상한선을 완화해 공급의 숨통을 터야 한다.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국민의 힘이 발의한 외국인 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서민 주거권 보호는 '강자와 약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때 가능하다. 지금처럼 서민만 옥죄고 강자는 방치하는 정책으로는 불평등만 심화될 뿐이다. 20~30대 신혼부부들이 집걱정을 안하고 편하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최악의 출산율은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그 누구도 말릴 방도없는 민주당은 또 누구나 결말이 뻔히 예상되는 길을 다시 가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