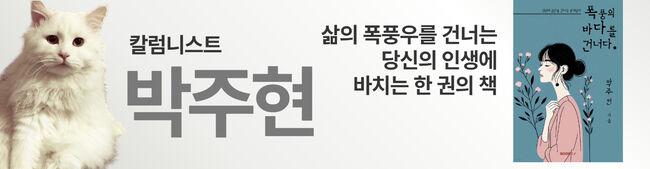<사진 = 외교부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7월 1일 오후,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의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유엔까지. 이재명 정부는 주요국 대사들에게 2주 내 귀국 명령을 내렸다. 마치 체스 게임 중반에 자신의 중요한 말들을 스스로 빼버리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정권 교체의 관례라고? 그럴듯한 명분이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내려진 이 조치를 보면서, 나는 우리가 정말 외교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치를 하려는 건지 헷갈렸다.
계엄으로 탄핵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관장들이 계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특임공관장 제도를 보면 답이 나온다. 현직 외교관이 아닌 인사를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이 시스템은 애초부터 정치적 논공행상의 놀이터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의 장경룡 주캐나다 대사 논란이 그랬다. 전문성? 그런 건 나중 문제다. 줄서기가 먼저고, 정치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번엔 뭘 얻었나?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그 대가는 너무 비싸다.
신임 대사가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려면 내부 인선부터 아그레망 절차, 신임장 제정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린다. 미국만 해도 아그레망이 4-6주는 기본이다. 그동안 주요 공관들은 대사대리가 맡는다.
문제는 대사대리와 정식 대사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다. 정상외교나 고위급 협상에서 대사대리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상대방도 안다. "어, 이 사람은 진짜 대사가 아니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대사대리 체제의 장기화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은 더욱 기막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6개월간의 정치적 공백을 겪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외교부 장관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런 판에 주요국 대사들까지 일괄 교체하니 '이중 공백'이 벌어졌다. 수술대 위의 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까지 뽑아버린 셈이다.
타이밍도 최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도 마찬가지다. 북러가 점점 가까워지고, 한중일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늘 강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외교 공백은 자살골이다.
그런데 웃긴 건,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사들을 줄줄이 갈아치운다. 외교는 마라톤인데 우리는 계속 100미터 달리기를 하고 있다. 숨이 찰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건 외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주요국 대사는 일정 기간 유임을 보장하거나, 최소한 신임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는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교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색깔보다는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외교 라인을 송두리째 바꾸는 관행, 전문성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문화, 외교의 연속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단기적 사고. 이런 게 반복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서서히 무너진다.
빈 대사관들을 보며 누군간 지금 웃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좀 말해줄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