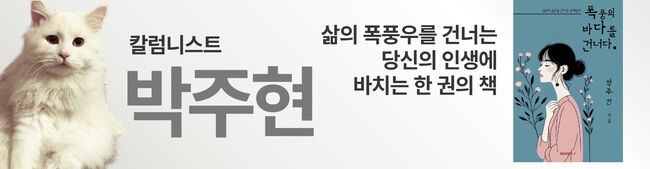한상균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오후가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행인처럼, 정부는 자신의 부처가 내일부터 시행할 정책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통치 기법을 목격했다. '3인칭 관찰자 정부'의 탄생이다.
관찰자 정부의 매뉴얼은 간단하다.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바람직한 결과"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온다. 실패하면 "해당 부처의 독자적 판단"이라며 객석으로 돌아간다. 성공은 1인칭으로 소유하고, 실패는 3인칭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문법을 따지지 않는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거절을 당한 서른 살 신혼부부에게 "이건 금융위 정책이지 우리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집값이 폭락해 깡통전세에 갇힌 세입자에게 "우리는 관찰자였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 기이한 건 이 정부가 관찰자 역할마저 제대로 못한다는 점이다. 진짜 관찰자라면 최소한 관찰은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점을,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의 경계선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관찰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결과가 나오면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젓는 '리액션 정부'에 불과하다.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책임 회피의 제도화'라고 부른다. 복잡한 정책 이슈를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실패 시 책임 소재를 흐리는 기법이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제2, 제3의 고 김문기처장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 대통령실이 받아야 할 비판과 비난을 일개부처 결정 담장자가 감내하기가 어디 쉽겠는가? 하지만 한국의 관찰자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아예 자신이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감독이 "나는 이 영화와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다. 부동산 정책은 거대한 생태계다. 금융정책, 조세정책, 토지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한 부처의 '독자적 판단'으로 작동하는 영역이 아니다. 정부가 관찰자를 자처하는 순간, 이 복잡한 시스템은 조율자를 잃고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후보시절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했다는 점이다. 보도블럭 하나까지 챙기는 성격이라 강조하며, 경제정책에서는 '정부 주도'를 강조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겸손해진다.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에 관찰자가 되고, 관찰이 필요한 순간에 침묵한다.
이런 태도의 끝은 뻔하다. 정책이 실패하면 "우리도 몰랐다"고 할 것이고, 성공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감독이 객석에 숨어있어도, 영화의 책임은 결국 감독에게 돌아간다는 걸.
3인칭 관찰자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통치의 본질을 오해했다는 데 있다. 통치는 관찰이 아니라 결정이다. 선택이고 책임이다. 관객석에서 박수치는 일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일이다.
머지않아 이 정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리 3인칭으로 말해도, 권력은 1인칭으로 작동한다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관찰자였던 정부는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자신이 관찰만 했던 모든 결과를 온몸으로 떠안아야 할 것이다. 박수도 야유도 없는 적막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