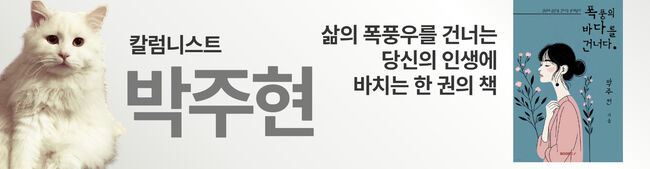<그래픽 : 박주현>
경제학 격언으로만 생각하던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후보딱지를 떼기 위해선 자신보다 정책으로 논란이 옮겨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가 ‘한 끼 5천 원’ 정책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본 순간, 떠오르는 광경이 있다. 점심시간이면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 식권 앱을 켜던 직장인들. 매번 오르는 점식물가에 걱정하던 그 들이, 3천~4천 원 보조금 덕분에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풍경. 국가가 1천~2천, 지자체가 1천~2천까지 보태면, 원래 1만 원쯤 하던 점심이 4천~7천 원으로 떨어진다니 누가 반기지 않겠나.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포퓰리즘 정책이 정신없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예언이, 어느새 눈앞에 현실처럼 펼쳐진 것이다.
4년 전만 해도 서울 직장인 점심은 평균 7천500원 선이었다. 그게 2022년엔 8천537원으로 오르고, 올 초엔 1만96원이란 기록을 찍었다.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값이 200~400원씩 오르는 걸 체감하며 살아온 우리는, 지원금이 풀리면 식당 주인이 당장 가격표를 다시 써내려갈 거라는 예상은 왜 못하는가?. ‘반값 점심’이라는 꿈이 열리자마자, 가게마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 삼아 메뉴판을 조정할 텐데 누굴 탓하겠나.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돈줄이다. 연간 수천억이 지자체 예산에서 빠져나가면, 재정은 벌써 터널에 조명 하나 달아 놓은 수준이다. 가계 통장에 돈이 찍히고, 그 돈이 시중으로 흘러들면 소비자물가라는 파도가 일렁인다. 이미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 안팎에서 춤추고 있다. 돈을 찍어 대는 순간, 통화량이 늘어나 온갖 물건값이 올라가는 건 교과서에도 나온다. IMF 외환위기 때 환율 폭등을 지켜보는 서늘함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인플레라는 그림자를 피해 ‘실체 있는 자산’으로 피신한다. 당장 내일 오를지도 모르는 물가 앞에 현금은 불안한 종이 한 장이고, 부동산은 그나마 버팀목처럼 보인다. 2025년 주택시장 전망을 보니 수도권은 1~2%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지역별 양극화는 심해질 거란다. 일부 ‘뜨는 지역’에 투자금이 몰리고, 나머지는 찬바람만 쌩쌩 분다. 결국 통화량 급증의 달콤함은 집값 롤러코스터를 불러온다.
이 장면을 한 편의 드라마라 생각해보라. 정치는 관객의 환호에 중독되고, 관객은 달콤함 뒤에 숨은 쓴맛을 잊은 채 박수를 친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점심값이 싸졌다고 안도하는 사이,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정책은 순간의 유혹, 후유증은 긴 여운이다. 물론 또 논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그저 검토라 한발 빼 긴 했지만, 두려울 따름이다. 별별 생각이 다 든다. 국민들 모르게 어디에서 유전이라도 터진 건가? 아니면 이재명 당시후보시절의 발언처럼 기축통화국이라도 된 건가? 아니 유전이 터지고 기축통화국이 돼도 직장인에게 매달 25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고작 삼주된 정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달콤한 점심 한 끼’가 실행된다면 그 뒤엔 물가와 집값의 롤러코스터가 대기 중이다. 결국 남는 건 미로 같은 시장에서 서로의 등을 떠밀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달콤함에 홀리지 않고 그 끝을 냉정히 바라보는 일이다.